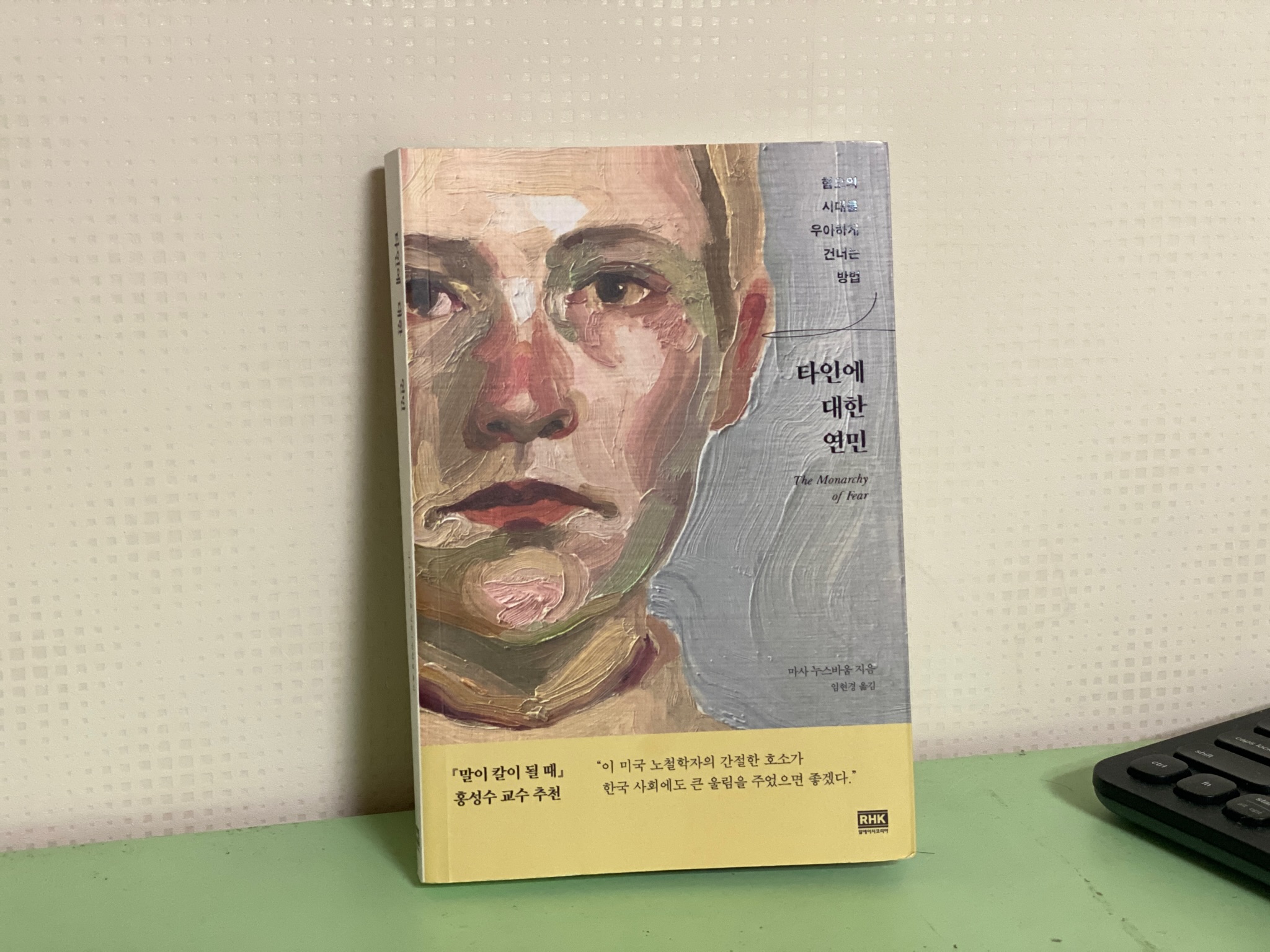이승희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다. 마치 명상과도 같은데, 책 속의 글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 최대한 힘을 빼려고 한다. 그리고 미간 사이의 긴장은 최소로 유지한다. 이 책은 시인이 쓴 산문이라 그런가 문장 하나하나가 운문 같아서, 시인은 잡아내어 “어이, 시인양반, 시는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이요?” 묻고 싶어진다. 시인은 슬픔이 많고, 끝끝내 마당이 있는 집을 구해 나무와 꽃을 심었고, 비 오는 날에는 화분들도 꺼내놓고 감히 식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. 잘 알아듣기 힘든 말이 있으나, 아는 듯 모르는 듯 모르는 듯 아는 듯, 그냥 읽어나갈 수 있어 좋다. 한숨 쉬는 시인에게서 나는 ‘아득바득’을 벗어나는 힘이랄까 의지를 배운다. 세상 초연하게 바라보면서도 그런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인의 싸움..